◇”여자 1위 왕수복, 남자 1위 채규엽”
“거리의 꾀꼬리요, 거리의 꽃으로 이 땅을 꾸미는 훌륭한 민중음악가 그는 레코드계의 가수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천재를 찾아냅시다. 당신께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가수의 이름을 남녀별로 적어서 우표를 붙여 보내주세요.” 1934년 11월, 잡지 ‘삼천리’에 실린 광고입니다.
여기서 ‘레코드’(Record)란 ‘턴테이블에 걸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든 동그란 판(板)’인데요. 예전엔 전축(축음기)에 올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SP판이나 LP판 같은 것을 ‘레코드판’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1980년대 무렵 CD(콤팩트디스크)로 발전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음반’이란 얘기죠.
1920~1930년대 축음기가 보급되면서 레코드를 낸 유명 가수들 중에서도 최고 인기 가수를 투표로 뽑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중가요와 유행가의 인기가 한창 치솟으면서 대중이 그 노래를 부른 가수에게도 관심을 쏟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시 투표의 반응은 뜨거웠는데, 전국에서 1만장이 넘는 편지가 잡지사로 몰렸습니다. 1935년 10월 발표된 최종 투표 결과 여자 인기가수는 왕수복(1903표), 선우일선(1166표), 이난영(873표) 순이었고, 남자 가수는 채규엽(1844표), 김용환(1335표), 고복수(674표) 순이었습니다. 당시 왕수복은 정오에 평양에서 공연한 뒤 비행기를 타고 경성(서울)에 내려 다시 청중 앞에 설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팬레터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열성 팬이 스타를 쫓아다니는 모습 역시 이 무렵부터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음반사가 요즘 연예기획사의 역할을 했는데, 음반사로 오는 팬레터가 한 달에 수백 장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팬이 편지를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직접 찾아가는 일도 잦았다고 해요.
가수 고복수(1911~1972)는 이런 회상을 했습니다. “한 번은 간도 용정(두만강 북쪽 지역의 마을)에서 ‘타향살이’를 불렀죠. 여관으로 돌아오니 어떤 낯 모를 젊고 어여쁜 여자가 찾아왔어요. 놀라서 웬일인가 하고 물으니 ‘선생님!’ 하고는 그만 방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쫙쫙 흘리며 울더라고요. 부평초(물 위에 떠 있는 풀)처럼 흘러다니는 자기 심정을 너무도 잘 울려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가수 김용환(1909~1949)도 “나도 여관으로 찾아온 여성 팬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훗날 고복수와 결혼해 ‘스타 커플’이 된 가수 황금심(1921~2001)의 회상은 이렇습니다. “제가 공연 여행을 다녀오면 회사에 편지가 쌓여 있었는데, 한 편지를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인생 고해(苦海·고통의 바다)를 저어가기가 너무도 괴로워 몇 번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당신의 노래를 듣고는 다시 살 생각이 났습니다’라고요.”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지망생들로 음반사 응접실에 불이 날 정도였는데, 당시 기획자들은 이렇게 투덜거렸다고 해요. “이거 원, 어떤 노래가 히트할지 통 알 수가 없어. 대중들 취향은 워낙 예측하기 어렵거든.” 이렇듯 1920~1930년대의 연예계 상황이란 21세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대중가요 가수들이 일제 치하에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조선 민중을 노래로써 어루만져 주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중음악사학자인 장유정 단국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요에 열광했던 당시 대중은 일제의 강압에 끌려 다닌 수동적 존재가 아니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그들 역시 꿈을 노래했고 사랑을 찬미했으며 이별을 아파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1930년대 최고 인기 가수 채규엽은 “유행가는 희로애락의 정서를 가장 교묘하게 표현한 불후의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즈’
193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이 출현합니다. OK레코드사를 설립했으며 ‘흥행의 귀재’라 불렸던 이철(1904~1944)이 결성했는데, 이미 ‘목포의 눈물’을 불러 스타덤에 올랐던 이난영(1916~1965), ‘연락선은 떠난다’를 부른 장세정(1921~2003) 등이 핵심 멤버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 여러 멤버들이 그룹을 들어왔다 나왔다 하며 5~6명 정도로 유지됐는데, 그중에는 ‘오빠는 풍각쟁이’를 부른 박향림(1921~1946)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대 의상으로 저고리를 입고 나와 나라 잃은 조선 백성들에게 민족의식을 환기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른 가수 김정구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고리 시스터즈, 그 얼마나 소박하고 우리 구미(무엇을 즐기거나 좋게 여기는 마음)에 맞는 이름입니까. 이난영과 장세정이 색동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썼죠. 서양 노래를 부를 땐 드레스를 맞춰 입었어요. 이들이 무대에 서면 훤했습니다.” 이들이 인기를 끌자 김해송·박시춘·송희선 등을 멤버로 한 ‘아리랑 보이즈’가 결성됐는데, 우리나라 보이그룹의 원조 격이라고 합니다.
[한류의 원조 ‘김시스터즈’]
‘김시스터즈’는 ‘저고리 시스터즈’의 뒤를 이은 걸그룹으로서 미국 진출에 성공한 가수입니다. 저고리 시스터즈의 멤버였던 이난영이 딸 김숙자·김애자와 조카 이민자를 발탁해 1953년 데뷔시켰던 것이죠. 기타·베이스·드럼 등 악기 20여 개를 직접 연주하고 춤까지 추면서 큰 인기를 끈 결과 1959년부터 14년 동안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여성 그룹은 미국에서도 드물었고, 이들은 ‘아리랑’ ‘도라지 타령’ 같은 한국 민요를 곁들인 공연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최초의 K팝 스타라고 할 만한 김시스터즈는 미국의 유명 TV 프로그램인 ‘에드 설리번 쇼’에 20여 차례 출연했는데, 이 쇼는 1964년 영국의 비틀스가 출연한 전설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63년 이들이 낸 첫 음반의 표지를 지금 보면 좀 씁쓸해집니다. 세 명 모두 중국풍 의상을 입었기 때문이죠. 당시만 해도 한복을 입은 모습이 미국 대중의 눈에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K컬처’(한국 문화)가 세계를 휩쓰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였던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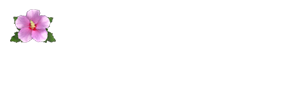



![[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의 한국사]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즈’… 나라 잃은 슬픔 달래줬죠 [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의 한국사]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즈’… 나라 잃은 슬픔 달래줬죠](https://img-s-msn-com.akamaized.net/tenant/amp/entityid/AAZN05K.img?w=534&h=307&m=6&x=57&y=57&s=593&d=121)

![[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의 한국사]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즈’… 나라 잃은 슬픔 달래줬죠 [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의 한국사]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즈’… 나라 잃은 슬픔 달래줬죠](https://img-s-msn-com.akamaized.net/tenant/amp/entityid/AAZN8Qv.img?w=534&h=392&m=6&x=551&y=220&s=96&d=253)
![[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의 한국사]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즈’… 나라 잃은 슬픔 달래줬죠 [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의 한국사]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즈’… 나라 잃은 슬픔 달래줬죠](https://img-s-msn-com.akamaized.net/tenant/amp/entityid/AAZN4WU.img?w=377&h=190&m=6&x=27&y=68&s=320&d=88)
![[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의 한국사]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즈’… 나라 잃은 슬픔 달래줬죠 [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의 한국사]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즈’… 나라 잃은 슬픔 달래줬죠](https://img-s-msn-com.akamaized.net/tenant/amp/entityid/AAZNucN.img?w=534&h=722&m=6&x=385&y=56&s=75&d=75)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