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벨과학상은 미국·유럽이 휩쓸까
이달 초 스웨덴 왕립과학한림원과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는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국내 언론은 속보와 함께 앞다퉈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노벨 과학상 누적 수상 1위는 미국이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 이어, 일본은 5위다. 이유가 궁금했다. 유럽 세 나라는 1652년과 1666년 사이에, 미국은 1863년 과학한림원을 설립했다. 일본은 1879년 일본제국한림원을, 한국은 116년 뒤 과학기술한림원을 세운다.
미시에서 거시로, 연구 지평 확장
1901년 뢴트겐에 이어 1920년까지 퀴리 부부, 톰슨, 플랑크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1921년부터 1933년까지 아인슈타인과 보어, 드브로이,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와 같은 유럽 물리학자가 메달을 목에 건다. 원자 크기의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밝힌 거장들이다. 빛은 한 번에 연필로 그은 게 아닌 무수한 점으로 된 선과 같고, 파동과 입자라는 두 얼굴의 야누스 같은 존재요, 물질은 에너지의 다른 이름이었다.
전후 이민정책과 연구비 증액
미국 노벨상 수상자 급증 이끌어
‘비용편익’강조는 순수연구 제약
정부, 세상에 없는 연구 지원해야
역전이 일어난 것은 1950년대 말. 1927년부터 컴프턴, 로런스, 체임벌린 같은 미국인들이 합류해 유럽을 앞질렀고, 1960년대 이후에 거시세계에 관한 연구로 지평이 확장됐다. 1967년부터 1978년까지는 별의 에너지 생성과 그 종말 단계에 다다른 중성자별, 빅뱅 직후에 남은 우주배경복사를 발견한 베테와 휴이쉬, 펜지어스와 윌슨 등이 영예를 안는다. 우주배경복사는 불 꺼진 재가 뿜어내는 열과 같다. 1983년에는 별이 늙는 과정과 우주의 원소들이 태어나는 비밀을 캔 찬드라세카르와 파울러에게 메달이 돌아갔다. 1993년과 2002년에는 헐스와 타일러의 중력 연구, 데이비스와 고시바, 쟈코니의 뉴트리노 발견이 인정됐다. 2006년 매더와 스무드는 배경복사 온도가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2011년에 펄머터와 슈미트, 라이스는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혀 그 주인공이 된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자문한 킵 손과 바이스, 배리쉬는 2017년 중력파로, 마요르와 켈로즈는 첫 외계행성을 찾은 공로로, 피블스는 우주론으로 2019년 선정됐다. 파격이다. 2020년 펜로즈는 블랙홀이 형성되는 과정을, 겐젤과 게즈는 우리 은하의 블랙홀을 찾아내 ‘블루 카펫’을 밟았다. 라이스는 허블우주망원경 데이터를 썼고 매더는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 과학자다.
일본 20세기 초반 기초과학에 사활
1949년 3월 11일 당시 미국 콜럼비아대 방문교수였던 유카와 히데키 박사(가운데)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뒤 동료 학자인 조지 피그램 박사(오른쪽)와 함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콜럼비아대 총장(왼쪽)을 뉴욕에서 만나 축하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전후에 미국 수상자가 급증한 것은 이민 정책과 법령 정비를 통한 연구비 증액 덕분이다. 대학을 늘린 것도 한몫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근대 국가의 틀과 연구 기반을 다졌다. 개화기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가른 요인은 셀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일본 집권층은 국제정세를 직시했다. 1917년에 일본은 이화학연구소, 즉 리켄을 세워 기초과학에 사활을 건다. 패전국인 일본 열도를 들끓게 한 것은 1949년 유가와 히데키의 물리학상 수상이다. 그 결실로 동시대의 일본인 17명이 과학상을 탄다. 1981년부터 20년간 일본 연구개발비 총액은 세계 2위였다. 고도 성장기에 투자를 늘려 수상자가 늘었지만 거품 경제가 꺼지고 기초과학 투자는 바닥을 친다. 3년 전 구십 나이에 물리학상을 탄 마나베 슈쿠로는 일본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의 조율과 번잡한 업무와 연구진 부족으로 고민하다 프린스턴대학에 눌러앉았다. 그는 지금 현직이다. 지난 4일 일본 기초과학자 수십만 명은 정부에 학술진흥회의 지원을 늘려 달라고 청원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아인슈타인 연구 핸드폰에 쓰여
1951년 3월 14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72번째 생일 당시의 모습. 게티 이미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7조 1항이 세상에 처음 빛을 본 1962년은 고인이 된 필자의 부모가 결혼한 해다. 세상은 변했는데 법이 환갑을 넘겼다. 누군가 항변한다. “과거에 소재와 부품, 장비는 ‘가성비’가 맞잖아 선택과 집중의 간택을 받지 못했었다. 연구가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비용편익’의 늪에 빠진다.” 헌법이 문제다.
다시 노벨 물리학상을 검색했다. 마르코니(1909년)는 그가 세운 ‘마르코니 라디오’를 통해 타이태닉 생존자들의 생명을 구해냈다. 그런가 하면 뢴트겐(1901년)이 발견한 X선은 전 세계 병원과 공항에서 쓰며, 라비(1944년)가 만든 핵자기공명장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대를 이었다. 방사선 연구로 12명이 물리학상을 탔는데 X선 진단, 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과 관련 있다. 플랑크(1918년)의 양자역학 원리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아카사키와 아마노, 나카무라(2014년)의 청색 발광소자(LED)는 TV와 핸드폰 액정화면에 들어간다. 바딘(1956년)과 킬비(2000년)는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IC)로, 카오(2009년)는 일상 깊숙이 파고든 광통신으로 메달을 건다.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1921년)로 상을 받았지만, 핸드폰 카메라에 쓰이게 될 줄 꿈엔들 알았을까. 연구계획서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어떻게 채웠을지 궁금해진다.
원시 블랙홀이 있다면 태양계에 마하 7천의 속도로 날아들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10년에 한 번꼴로 화성을 쿵, 때리고 공전궤도가 흔들려 그 진동을 재면 운 좋게 암흑물질의 비밀을 풀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 연구자는 세상에 없는 걸 파야 하고, 국가는 시간을 부모처럼 인내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1. 문홍규, "왜 노벨과학상은 미국·유럽이 휩쓸까", 중앙일보, 2024.10.28일자. 2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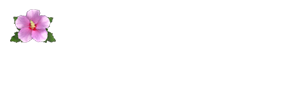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