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
질식하는 한국 대학을 살리려면
며칠 전 필자는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실을 정리하고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연세대 의과대학으로 부임하기 위해서다. 미국 유학부터 시작한 타향살이 17년 만의 고국행이다. 처음엔 박사학위를 받으면 곧 돌아와서 모국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런데 운 좋게 연구 환경과 교수 처우가 좋은 미국과 홍콩의 대학에 재직하게 되니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이 쉽지 않았다.
다년간 교수채용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필자 자신이 구직자가 되기도 했었다. 심지어 연세대 교수 채용 계약에 서명하는 날에도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신임 교수 채용에 관여하고 있었다. 해외 대학의 인재 유치 환경과 국내 대학 간의 간극을 생생히 경험했다.
대학은 연구개발·혁신의 기지
열악한 처우로 인재 확보 실패
교원 연봉, 경쟁 대학 절반 수준
등록금 자율, 성과급 확대 필요
외국인 교원·학생 대폭 늘리고
우수 인재 소득세 혜택 검토를
북미 대학, 외국인 교수·학생 50% 넘어
우우르 샤힌 박사와 아내 외즐렘 튀레지가 미소를 짓고 있다. 이민자 가정 출신인 이들은 바이오엔텍(BioNTech)을 설립하고 화이자와 협업하여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 AP=연합뉴스
대학에 뛰어난 인재 유치가 왜 필요할까. 이는 대학이 연구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과 혁신의 전초 기지이자 인재 양성 및 유치의 가장 중요한 채널이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2024년 세계발전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 국가들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 혁신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산학 협력을 주문한다.
가령,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mRNA백신인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 백신을 만든 이는 터키 출신 이민자인 독일 대학교수 우우르 샤힌(Ugur Sahin) 박사와 그의 아내 외즐렘 튀레지(Ozlem Tureci)다. 또한 옥스퍼드-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은 영국 옥스퍼드대 제너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혁신이 산학협력으로 이뤄짐을 잘 보여주는 예다.
또한, 모든 연구자는 대학에서부터 길러지며, 대학은 인재 유치의 핵심 채널이다. 미국 대학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인재가 모이는 곳인데, 외국인의 경우도 미국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많다. 가령,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7대 기술 기업(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중 4개의 최고경영자(CEO)가 외국 태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구글의 순다르 파차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유학생 출신이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어릴 때 대만에서 이민 온 1.5세다.
낮은 연봉, 열악한 연구 환경이 발목
국내 대학도 더이상 한국인만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북미 대학은 물론 홍콩·싱가포르 내 아시아 정상권 대학의 외국인 교수 및 학생의 비율은 50%를 넘는다. 세계에서 모여든 인재들이 용광로처럼 녹아 혁신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 비율이 5~10%에 불과한 대한민국과 차이가 크다. 대학은 다양한 인재를 빨아들이는 채널이 되어야 발전한다.
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가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비관적이다. 핵심적 이유는 낮은 연봉과 큰 강의 부담 같은 불리한 교수 처우 및 연구 환경이다. 대학교수도 생활인이고 대학교수 채용에도 시장 원리가 작동하므로 처우가 좋은 곳으로 고성과자들이 이동한다. 능력이 뛰어난 세계적 학자들이 한국 대학으로 오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연봉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 미국 상위권 대학의 경제학 신입 조교수 연봉은 2억원이 훌쩍 넘는다. 홍콩·싱가포르도 이와 비슷하고, 여기에 더해 월 수백만 원의 집세 보조를 제공한다. 연구 중심 대학의 교수는 이렇게 연봉이 높지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중심 대학의 교수 연봉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억원 수준이다.
국내 주요 대학은 조교수 초봉이 7000만원 수준이고, 정교수 연봉도 1억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호봉제가 적용되므로 능력 있는 교수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강의 시수에도 차이가 있다. 필자는 미국 코넬대에서 1년에 평균 2과목을, 홍콩과기대에서는 2.5과목을 가르쳤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연구 중심 대학교에서조차 1년에 3~5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필자가 종신 교수직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의과대학 교수의 연봉이 다른 과에 비해 높고 강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 컸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용병처럼 살지만, 대한민국에선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도 매력적이었다.
물론 국내 교수의 연봉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는 높다. 하지만 연구 개발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까지 말아야 한다. 높은 수준의 연구자는 그에 걸맞게 대우하고, 연구를 게을리하는 학자는 연봉을 삭감하거나 심지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 기반 장학금’ 늘려 인재 길러야
이런 의미에서 16년째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은 대학의 경쟁력에 큰 피해를 주었다. 대학이 일정 수준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 장학금(2형)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부적절하다. 대학 등록금의 자율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소득에 따른 장학금도 대폭 확충하자. 필자가 재직했던 코넬대의 학비는 연간 1억원 수준인데, 이 중 약 4000만원을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으로 쓴다. 부모의 연 소득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학비가 무료다. 우리도 등록금을 상향 조정하고 정부 지원을 늘려서 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돈 걱정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필자가 그동안 재직했던 학교는 교수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잘 갖춰져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프로젝트를 할 이유가 없다. 연구할 시간도 모자라는 판에 각종 정부 위원회와 외부 강연이 주요 수입원이 되는 일은 더욱 없다. 대신 연구를 잘하면 성과가 연봉에 잘 반영된다. 반면 성과가 없으면 테뉴어(종신교수)가 안되어 해고되고, 테뉴어를 받아도 꾸준히 연구하지 않으면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
해외와 국내 대학교수 겸직 허용해야
예를 들어 홍콩과기대는 매년 인건비 예산이 평균 3% 정도 오르는데, 연봉은 1.5%만 자동으로 오른다. 나머지 예산으로 연구 성과에 따라 기본급을 조정한다. 그 결과 부교수 및 정교수의 연봉은 업적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은퇴 무렵이 되어도 조교수와 비슷한 사람도 있고, 연봉 5억원을 넘는 교수도 있다. 반면 한국 대학은 연구를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외부 활동을 통해 과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아래서는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만다.
언어도 문제다.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외국인 교수가 안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KDI school)가 좋은 본보기다. 43명의 교수진 중 외국인 교수는 3명이지만, 교수 회의 및 교내 이메일이 영어로 진행된다. 학생도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다. 그 결과 외국인 교수 정착이 수월하다.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관공서, 금융기관 등을 활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반면, 국내 대학에 재직 중인 많은 외국인 교수가 배우자의 한국 선호로 어쩔 수 없이 국내에 체류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이방인처럼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에서 영어가 한국어와 동시에 쓰여야 외국인 교수가 진짜 학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스웨덴과 대만, 중국 광둥성처럼 고학력 외국인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 감면도 고려하자. 숫자도 부족하고 값비싼 국제학교도 과제다. 가령 포항에는 포항공대에 부임한 외국인 교수가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국제학교가 없다. 국제학교가 80개나 존재하고,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인구 700만명의 홍콩과 극명히 비교된다.
또한 KAIST처럼 교수들에게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에 겸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이는 국제 네트워크 강화로 이어진다. 해외 인재가 국내 정착도 돕는다. 반면 서울대에 부임하려면 기존의 학교를 사직하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외국 대학교수의 입장에서는 해외 연구비를 포기해야 하고, 한국에 적응하는 기간이 시간 낭비가 된다.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에 갓 부임한 베트남 출신 트린 팜 교수의 인생 역정을 소개했다. 사실 그는 필자의 코넬대 마지막 박사 과정 제자였다. 그녀와 한국 행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외국 학자 유치의 힌트를 얻었다.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해당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때 한국에서 받은 환대는 박사 이후 한국행을 택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부모님이 계신 베트남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도 한몫했다.
선진국 안착을 노리는 대한민국에 혁신은 필수다. 핵심 과제는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대학이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지난번 퍼스펙티브(중앙일보 7월 4일 자 24·25면) ‘최상위 학생 모두가 의사 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에서 지적한 극단적인 의대 쏠림과 함께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한 인재 활용의 대표적 실패다. 이대로 놓아두면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려 ‘혁신 부족’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도 째깍째깍 애타게 시간이 간다.
<참고문헌>
1. 김현철, "대학의 우수 이내 유치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 중앙일보, 2024.9.12일자. 2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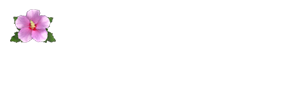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