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학의 아름다움이 서사가 된다면
새러 하트 지음│고유경 옮김│미래의창
■ 수학이 생명의 언어라면
김재경 지음│동아시아
수학 = 서사
시 운율 느끼는 바탕은 수학
4차원도 수학자 상상서 시작
수학 = 생명의 언어
방정식으로 생명현상 풀어내
신약 개발·암 치료에도 활용
수학은 하나의 이야기다. 숫자와 기호의 향연 속에 무슨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말인가. 의아할 이들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이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 교수직인 그레셤 기하학 교수직을 맡고 있는 수학자 새러 하트가 한 권의 책에 걸쳐 만들어낸 수학과 문학의 연결성은 바로 그 증거다.
대표적인 예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 딕’이 있다. 대부분의 독자가 ‘거대한 흰 향유고래’로 기억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하트 교수에 의해 흥미로운 수학 소설로 재구성된다. 소설은 많은 이들이 놓치고 지나갔을 수학적 비유로 가득 차 있다. 이를테면 소설 속 주인공 이슈메일이 갑판에 있는 냄비를 청소하는 장면에서 냄비 속 비누 돌의 움직임은 ‘사이클로이드’에 비유된다. 직선 위로 원을 굴렸을 때 원 위의 정점이 그리는 곡선을 이르는 말인 ‘사이클로이드’는 그 모양이 아름다워 “기하학의 헬레네”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이를 알고 있는 독자라면 비누 돌의 움직임이 얼마나 우아하고 유려한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
문학에는 ‘모비 딕’ 속 ‘사이클로이드’처럼 숨어있는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난다. 단지 독자에게 발견되지 못했을 뿐.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장르는 역시 ‘시’다. 운율이 존재하는 시 문학은 수학에서 중요한 요소인 반복과 제약이 존재한다. 제약이 운율이든 압운 형식이든, 각 연에 행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든 관계없이 행 바꿈이나 연, 운율은 시에서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운율을 느끼고 향유하는 방식의 기저에는 수학적 사고가 있다.
여기서 나아가 수학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가들도 있다. 앞에 언급한 허먼 멜빌은 편집자가 “다음 책에는 형이상학도 원뿔 곡선도 넣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수학을 사랑한 작가였다. 제임스 조이스는 대표작 ‘율리시스’에서 거듭제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미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조명했다.
사실 수학은 그 자체에 서사와 상상이 있다. 예컨대 숫자 3에 관한 이야기는 소설보다 흥미롭고 설득력이 높다. 기하학에서 숫자 3은 매우 특별하다. 우선 숫자 3은 2차원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은 점의 개수다. 누구든 같은 길이의 막대 3개로 삼각형을 만든다면 똑같은 삼각형을 만들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리고 한 평면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점의 개수는? 역시 3개다. 서로 같은 거리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이자 하나의 도형을 구성할 수 있다는 수학적 특징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삼각관계, 삼총사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3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인간이 완전함, 공평함, 단단함을 느끼는 이유는 수학에 있다.
수학적 상상은 문학을 통해 구현되기도 했다. 수학 자체가 창작의 핵심인 상상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은 ‘4차원’이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다. 우리가 자각하는 3차원에서 시간의 차원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4차원’은 수학자들의 상상에서 출발했고 창작자들에 의해 구현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자각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커트 보니것의 소설 ‘제5 도살장’에서, 보다 시각적으로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미래에서 온 주인공 쿠퍼가 ‘바벨의 도서관’에서 딸과 소통하는 장면은 수학이 만든 결과물이다.
여기서 수학의 매력에 빠진 독자라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책이 있다. 김재경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교수는 저서 ‘수학이 생명의 언어라면’을 통해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수학이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짚어낸다. 수학은 생물학적 현상을 방정식으로 풀어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신약 개발과 암 치료에 활용된다. 이처럼 복잡한 생명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분과 적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수학을 통해 과학 연구를 설명하는 만큼 다소 진입장벽은 높지만 앞서 하트 교수의 주장과 김 교수의 주장에는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수학은 언어’라는 것. 수학이 문학과 과학의 영역을 오갈 수 있는 비결은 수학이라는 언어가 가진 절대적인 보편성에 있다. 수학은 어디서나 완벽하고 그대로 존재한다. 실생활에서 완벽한 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도 수학 속에서 원은 완벽한 형태로 존재한다. 수학에는 모든 분야를 넘나드는 힘이 있다.
수학만큼 편견과 오해로 뒤덮인 학문이 있을까. 고등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멀어진 문과와 이과의 간극은 문과생에게 수학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 과목으로 만들었고 이과생에게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감수성의 정수를 문학으로 만들어냈다. 이제 그 오해를 넘어 다시 한 번 수학을 마주할 시간이다. 인간의 삶과 역사는 지저분하다. 실제 세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다. 그 속에서 수학이라는 완벽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참고문헌>
1. 신재우, "미분 적분으로 만든 이야기들, 수학은 완벽한 문학", 문화일보, 2024.8.30일자. 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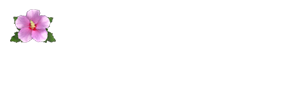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