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만장의 의미와 유래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시인, 문학평론가) 대산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시인, 문학평론가) 대산 신상구
만장(輓章)이란 고인에 대해 애달프게 슬퍼하며 지은 시를 말한다. 만장은 만사(輓詞)라고도 불렀다.
만장의 유래는 중국 춘추전국시대(기원전 770-221)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례 행렬에서 상여의 뒤를 따르던 사람이 죽은 사람을 추모하며 애절하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를 만가(挽歌)라고 한다. 만가는 세월이 흐르면서 죽은 자를 추모하는 한시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만가는 한(漢)나라 무제(武帝, 기원전 141-87) 때 이르러 장례의 정식 절차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나라에서는 장례 때에 왕족이나 귀족에게는 해로(薤露)라는 시를 만가로 부르게 하였고 사대부나 평민에게는 고리라는 시를 만가로 부르게 했다. 그후 시문학과 예술이 발달했던 당나라 때 와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만장이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장은 고려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을 비롯한 명현들의 문집에서 발견되고 고려 후기 무신 집권기에 들어와서는 양적으로 늘어났다. 조선시대에는『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영향으로 유교식 장례의례가 보급되면서 고인을 기리는 만장을 짓거나 이를 상가에 보내는 일이 활성화되었다. 이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깃발 형태의 만장으로 만들어 장례 행렬에 사용한 것도 만장이라 하는데, 고려 말 성리학자인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장례에도 이를 사용했다고 전한다. 16세기 이후에는 성리학이 정착되면서 만장을 짓거나 장례 행렬에 사용하는 것이 중시되어 서민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깃발로 쓰인 만장의 경우 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길이는 약 240Cm(8자), 폭은 약 60Cm(2자) 내외였다. 색상은 백, 청, 홍, 황 등 다양했다. 만장의 개수는 왕, 왕세자, 왕세손과 그 비들의 장례와 같은 국장급의 경우 96개를 만든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상에 따라 그 가짓수를 달리했다.
신분이 엄격한 조선사회에서 양반들은 주로 부인, 자식, 형제, 벗을 대상으로 만장을 지었는데 노비와 기녀를 대상으로 한 만장도 적지 않았다. 문신 김려(金鑢, 1766-1822)는 젊은 시절 자주 드나들던 술집 주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모와의 과거를 회상하며 공허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만장은 죽음 앞에 신분의 벽을 넘어 애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만장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로는 조선 후기에 밀양으로 귀양갔던 이학규(李學逵, 1770-1835)의 글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주민들로부터 서울에서 온 문사라고 온갖 문자를 써달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나무꾼이나 소치는 사내, 떡 파는 아줌마, 주모를 따질 것 없이 걸핏하면 지본(紙本 : 종이) 하나를 마련하여 이리저리 쫓아가서 만사를 지어달라 구걸한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에는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의 상갓집에 만장을 써 보내는 것을 가장 큰 부조(扶助)로 생각했고, 받은 상가에서는 영광으로 여겼다.
사람들은 만장의 수효에 따라 망자의 덕망과 학식을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세간(世間)에 학식과 덕망이 높다고 알려진 사람으로부터 지은 만장을 받은 망자는 더 높게 평가받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1. 손영배, “만장”, 대순진리회,『大巡會報』277호, 대순 154년. 2025.2. pp.5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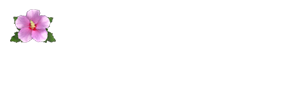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