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회를 이끌어온 이학래옹 타계를 추모하며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의 B·C급 전범(戰犯)으로 몰려 사형 판결을 받은 23명의 동포를 알고 계시나요?”

당시 사형 선고를 받고 1956년까지 일본 도쿄 스가모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석방, 남은 여생을 조선인 전범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바친 동포가 있다. 이학래옹이다. 지난달 28일 향년 96세로 영면했다. 그는 조선인 전범자 중 유일한 생존자였다.
이학래옹은 1925년 전남 보성에서 소작농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2년 일제가 약 3000명의 조선인 청년을 징집했고 당시 17세의 이학래옹은 반강제적으로 포로감시원에 지원해야 했다. “자네 그런 말 하지 말고 갔다 와라.” 당시 마을의 유력자가 17세의 그에게 한 말이다. 고향을 떠난 뒤 평생 돌아가지 못한 그는 이 말을 몇 번이나 곱씹었을까.
부산에서 2개월간 군사 훈련을 받고 태국의 일제 포로 수용소에서 제대로 된 음식도 의복도 없는 열악한 현장에서 그는 호주군 등 연합군 포로의 감시를 담당했다. 그곳에서 1945년 해방을 맞았다. “형무소 건물의 입구 근처에서 조선인 동료들과 모여 같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조국이 해방되어 독립됐다는 기쁨에 모두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이학래옹의 자서전 ‘한국인 B·C급 전범의 호소’ )
조국 해방의 기쁨과 고향에 돌아갈 희망도 잠시, 그는 연합국의 전범 법정에서 일본 군속으로 재판을 받았다. 제대로 된 변호사와 통역도 없는 가운데 1947년 포로학대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전범이 된 조선인은 148명(그중 23명은 사형)이었고 대부분은 포로감시원이었다.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한 A급 전범을 처리한 도쿄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7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였다.
조선인 B·C급 전범들은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전쟁을 책임져야 했지만, 1952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는 그들을 ‘외국인’으로 보고 원호 조치 대상에서도 배제했다. 재일 한국인 B·C급 전범자와 유족 약 70명은 1995년 동진회라는 모임을 결성, 이 부조리를 호소했지만 일본 정부는 미동도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들은 외토리였다. ‘친일파’로 여겨졌던 것이다.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조선인 B·C급 전범과 유족 68명의 피해가 인정됐지만, 재일교포였던 이들은 위로금이나 지원금 대상에선 제외됐다.
동진회는 2014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한국 정부가 조선인 전범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제소했다. 앞선 2011년 헌재가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같은 논리로 위헌 판결을 한 데 기대를 건 것이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헌재는 동진회의 제소에 대해 아무런 견해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나는 사형당한 동료의 명단을 항상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자 지금 제가 죽어도 그런 마음으로 죽으려 합니다.”(일본 잡지 ‘세카이(世界)’ 2020년 9월 호 인터뷰)
이학래옹은 영면했지만, 이달 1일 200명(비대면 참가 약 100명) 이상이 참가해 일본 의회에서 항의 집회를 했다. 그의 싸움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활동의 중심은 대부분 일본 사람이다. 이학래옹의 호소에 도덕과 양심이 움직인 일본인들이다.
재일교포 3세인 나는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도덕과 양심에 묻고 싶다. 열일곱 살에 반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나 96세까지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온 그는 과연 친일파인가. 조국에 무거운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나.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고스란히 주홍글씨로 새긴 채, 일본과 한국 그 사이에서 끝까지 억울하게 죽은 조선인 전범을 위해 싸운, 이학래라는 조선인을 잊지 말아주세요.”
<참고문헌>
1. 김귀자, "이학래옹을 잊지 말아주세요", 조선일보, 2021.4.13일자. A2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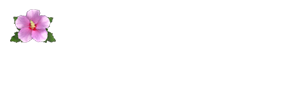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