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민엽 문학평론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이 시간에 저는 5개월 전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동훈 장관(당시)이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하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던 장면입니다. 이 말은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 루쉰을 인용한 것입니다.
정치가가 문학을 인용하고 시를 인용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정치라는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 문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개탄스러운 것이겠죠. 비록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더욱, 한동훈 전 장관의 루쉰 인용이 제 기억 속에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루쉰의 글을 인용했다. 김성룡 기자
인용된 루쉰의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편소설 ‘고향’(1921)의 끝부분입니다.
“사실은,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자 길이 된 것이다.”
루쉰의 이 유명한 구절은 유명한 반면에 너무 쉽고 단순하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절에는 복잡하고 심각한 고뇌가 들어 있는데 이 점이 흔히 간과됩니다. 루쉰이 길을 이야기한 것은 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희망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 인용문 바로 앞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지상의 길과 같다.”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 루쉰은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었습니다. 이 말보다 좀 더 앞에 나오는 “지금 내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도 나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닐까”라는 의문문이 루쉰의 회의와 비관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루쉰이 희망을 길에 비유한 것은 비관에만 빠져 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온전히 낙관으로 건너가 버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연법칙으로서의 길의 생성이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자연법칙이라면 길도 희망도 낙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루쉰이 제시한 것은 이미 있는 길이고 그것은 경험적 사실일 따름입니다. 이미 있는 길이 아직 없는 길을 보장해주거나 확정해주지는 못합니다. 희망은 이미 있는 길과 아직 없는 길 사이의 불확정적 존재입니다.
일찍이 1980년대에 한국 시인 황지우도 길에 관해 루쉰을 연상시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지우의 길은 길 없는 곳에서 길을 가고 있는 자의 길입니다.
“經이 길을 가르쳐 주진 않는다
길은,
가면 뒤에 있다”
시집 『나는 너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길이 없는 사막을 낙타가 갑니다. 가고 나면 낙타의 발자국이 남겨져 길이 됩니다. 그래서 “길은, 가면 뒤에 있다”라는 진술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마음의 지도 속 별자리’가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가면 뒤에 있는 길’을 계속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막의 이 길은 루쉰의 길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길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의 길이고 만들어진 뒤 곧 사라지는 일시적인 길입니다.
황지우의 다른 시 ‘눈보라’에서는 장소가 눈 내리는 산으로 바뀝니다.
“가면 뒤에 있는 길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앞에 꼭 한 길이 있었고, 벼랑으로 가는 길도 있음을
마침내 모든 길을 끊는 눈보라, 저녁 눈보라,
다시 처음부터 걸어오라, 말한다”
이 시의 화자는 지나온 길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다』에서는 ‘가면 뒤에 있는 길’을 그 길이 올바른지 아닌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갈 수밖에 없었던 데 비해, 이 시의 화자는 ‘가면 뒤에 있는 길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올바른 길이 꼭 하나 있었던 것인데 화자가 간 길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눈보라가 모든 길을 끊으면서 화자에게 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걸어오라고. 이 눈은 이미 나 있는 발자국들을 다 덮어 사라져버리게 하는 눈, 즉 이미 있는 길을 없애는 눈입니다. 이 눈은 후회와 반성의 눈입니다.
시집 『나는 너다』는 1987년 1월에 출판되었고 시 ‘눈보라’는 1988년 1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 ‘눈보라’가 돌아보는 길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과 관련된다는 것을.
길이 사람들이 감으로써 생겨난다는 말은 루쉰의 독창이 아닙니다. 『장자(莊子)』의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 길은 사람이 다녀서 생긴다)”을 비롯해서 동서고금에 걸쳐 유사한 잠언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루쉰도 황지우도 그 잠언의 단순한 반복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길에 대한 단순한 낙관이나 반성 없는 확신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고뇌 어린 성찰을 수행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문학의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문헌> 1. 성민엽, "한동훈의 길, 루쉰의 길", 중앙일보, 2024.5.23일자. 2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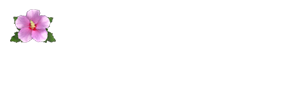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