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를 한국 전통지리학으로 정초한 최창조 선생을 기리며
스승은 죽어서 제자를 가르친다고 했다. 입춘을 하루 앞두고 유난히도 따뜻했던 2024년 2월3일, 선생님을 화장한 한 줌의 유골은 경기도 양주 다볼산 묘원의 서쪽 기슭, 부모님이 계신 아랫단 반 평도 안 되는 자리에 모셔졌다. 당신이 묻힐 자리를 생전에 정할 생각도 안 하시고, 주어진 자리로 이승에 남은 몸은 온전히 돌아가셨다. 일세를 풍미하던 풍수의 스승이 묻힌 그곳은 선생님이 만년에 가르치신 자생 풍수의 마음 명당이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숙세의 인연이라고 했던가. 어제인 듯 34년 전에, 전북대에서 서울대로 부임하신 선생님을 운명처럼 만났다. 8년 대한에 단비를 만난 듯 선생님의 가르침을 메마른 대지처럼 받아들였다. “산은 살아있다”는 한마디 말씀에, 내 속에 굳어있던 땅은 생명의 땅으로, 죽음의 풍수는 삶의 풍수로 일순간에 바뀌었다. 제자들에게 한평생 선생님이 전수하신 풍수 디엔에이(DNA)는 ‘생명의 지리, 삶의 지리’였다.
선생님은 항간의 미신이나 술법으로 회자하곤 했던 풍수를 학문의 반열로 올리고, 이기적인 속신이었던 풍수의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평생 헌신했다. 그것도 과거 전통지식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현대와 미래에 환경생태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상으로 풍수를 올려놓았다. 후반기에는 중국 풍수와는 다른 한국적인 자생 풍수의 정체성과, 땅과 사람이 상보한다는 비보적 사상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땅을 어머니처럼 내 몸처럼 대하라는 선생님의 사회적 메시지는 오늘날의 환경훼손과 기후위기에 커다란 통찰과 울림을 던졌다.
선생님의 학자 일생은 1992년에 서울대 교수의 사직을 기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크게 나뉜다. 교수로 계실 때까지는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제자를 양성하면서 지리학으로서 풍수의 학문적 기초를 닦았다고 한다면, 사직하고 나서는 대중들에게 강연하고 저술을 하면서 사상으로서 풍수의 사회적 토대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전통 지리학의 지식 체계였던 풍수의 학문적 복원과 현대 지리학적 해석은 선생님의 주도와 저술로 시작되고 본격화되었다. 전반기의 선생님은 묘지 풍수론에서 삶터 풍수론으로 중심축을 전환시켰고, 후반기에는 중국의 술법 풍수와 차별화하면서 한국의 자생 풍수를 개진했다.
선생님의 지리학적 풍수의 천착은 1984년의 기념비적인 저술인 ‘한국의 풍수사상’에서 전기를 이룬다. 출판된 지 4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이 책을 뛰어넘는 풍수 개론서가 없다는 사실만 하여도 학술적 가치와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전통 풍수는 이론적, 사상적으로 복원되고 제자리의 방향타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어지는 여러 저술을 통해 선생님은 ‘땅의 풍수에서 사람의 풍수’로 한국 풍수의 기조를 세웠다.
만년에 몰두하신 자생 풍수는 외래 풍수(중국 풍수)와 대별되는 한국 풍수의 기원 및 정체에 관한 개념 체계였다. 그것은 중국의 발복 풍수와 대비되는 한국의 대동 풍수로서, 비보 풍수와 개벽 사상으로 구성되었다. 자생 풍수의 비조는 신라 말의 승려 도선(827∼898)이었다. 그래서 개념 체계로서의 자생 풍수는 역사적 인물로서 도선 풍수이었고 그 속성은 비보 풍수였다.
선생님은 마지막 저서인 ‘한국 자생 풍수의 기원, 도선’(2016)에서 “풍수 공부의 최종 목적은 도선의 자생 풍수를 더듬는 것”이라면서, 결론에서 이런 말로 끝맺었다. “도선은 우리 고대 사상을 융합하여 자생 풍수를 정리한 사람이다. 필자는 그를 존경하며 사랑한다.” 아니나 다를까 그랬다. 선생님은 진정 이 시대의 도선이셨다.
1990년 2월, 군 복무를 마친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풍수를 전공하기 위해 처음 선생님을 만나 뵈었다. 선생님은 그때 강단 풍수를 하겠느냐고 물으셨다. 학문으로서 풍수를 전공할 작정이면 해도 좋다는 말씀이셨다. 선생님은 전통적 풍수 사상이 지리학의 한국적 정립을 위해서 필요하고, 현대 지리학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에 대한 지리학계의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서울대에 부임하고도 풍수는 교과 과목으로 자리 잡지 못했으니, 교수로서의 존재 기반도 이유도 없는 셈이었다. 결국 선생님은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만 재직하고 대학을 사직하셨다. 한 세대가 지난 지금에도 지리학계와 지리학과의 사정은 변한 것이 없다. 풍수 전공 교수도 없으니 학문 후속 세대도 끊겼다. 사직 뒤 제자들이 함께 댁으로 책을 옮겼는데 “책이 누워있다”고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 후론 외로운 저술과 통음을 반복하셨다. 길지만 짧은 세월이 지났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직후 사모님의 전화를 받았다. 다시 부랴부랴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아침에 문병했을 때만 하더라도 알아보시고 손이 따뜻했는데. 침대에 편안히 누워 감은 눈 아래로 맑은 눈동자가 비쳤다. 편안하시고 초연하셨다. 이것이 내가 본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제자들은 모두 선생님의 가시는 길을 운구하고 지켰다. 화장해 한지로 싼 나무곽 위로 고운 흙을 덮어 드렸다.
아! 선생님의 ‘혼’은 맑디맑은 우리 산천에 깃들어 바람과 물의 기운으로 돌아가셨네. 선생님의 ‘백’은 그리도 아끼고 사랑하던 우리 땅에 스며 한 줌 향기로운 흙이 되셨네.
선생님! 저희 제자들은 살아생전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죽어서도 선생님 곁에 가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최원석/경상국립대 명산문화연구센터장‧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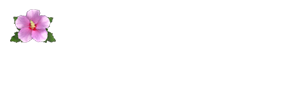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