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지 않는 산내의 눈물]
전미경 대전산내사건 유족 회장
좌익활동 한 삼촌 돕고 숨어지낸 아버지
딸 첫걸음마 소식 듣고 돌아왔다 잡혀가
1951년 3월 4일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
골령골 유해 1441기 DNA검사도 못해
유족 늙어가는데 평화공원 첫삽도 못떠

유난히 햇빛이 뜨거웠던 지난 19일, 대전 산내 골령골을 찾았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무거운 명칭과 달리 그곳은 숲이 우거진 도로 그 뿐이었다.
군데군데 걸린 산내사건 피학살자 유족회가 걸어둔 현수막만이 이 곳의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그리고 그 길 가운데 덩그러니 위치한 대전 산내사건 피학살자 유족회 사무실에서 유족회장 전미경(여·77)씨를 만났다.
반갑게 기자를 맞이하는 전 씨의 미소 너머엔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아픔과 그리움이 얼핏 느껴졌다.
어떻게 운을 뗄 지 고민하던 찰나 전 씨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어나갔다.
-첫 걸음마를 뗀 날, 아버지는 닿지 못할 곳으로 가버렸다
전 씨는 생후 24개월에 아버지를 잃었다.
일생의 절반을 산에 숨어살던 아버지는 막내딸 걱정에만 잠 못 이루던 분이셨다.
두 돌이 다 됐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평생 걷지 못할까 노심초사 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1951년 1월, 전 씨는 처음으로 두 발로 섰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는 그날 자정 산에서 내려왔고, 한밤중에 번쩍 안아들어 일으켜 세웠을 때 두 발로 선 전 씨를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유난히 고요하고 또 눈물겹던 전 씨 가족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설마 이 밤중에도 잡으러 올까’ 했던 안일함 때문이었을까.
잠복해있던 경찰들은 전 씨네 집을 들이닥쳤다.
그렇게 끌려간 그의 아버지는 다시는 닿지 못할 곳으로 영영 떠나버렸다.
아버지 전재흥 씨는 무명옷에 피가 배어나도록 구타를 당하며 끌려갔고, 서천군 시초면 시초지서를 지나 서천경찰서로, 거기서 또 다시 대전형무소로 옮겨졌다.
부역자로 몰려 학살당했다고 추정되는 날짜는 1951년 3월 4일, 제사일은 3월 2일이다.

-그리움 속 성장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는 7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그를 울렸다.
전 씨가 태어난 다음날 산에서 내려와 집에 몰래 들어왔다 경찰에 끌려갔던 그는 겨우 살아 돌아온 뒤 농사만 짓겠다고 결심했다.
전 씨의 언니는 일찍이 죽고, 오빠도 네 살 무렵 우익단체 사람들에게 독살 당해 그는 무척 소중한 막내딸이었다.
아버지는 핏덩이 같은 전 씨를 안고 “내가 다시 끌려가면 돌아오지 못 할 텐데, 널 두고 어떻게 가겠느냐”며 막내 딸의 얼굴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하지만 좌익 활동을 계속 이어간 삼촌이 잡혀갈까 넘겨준 그의 도민증이 또 다시 하나의 죄가 됐다.
전 씨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버린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언젠가 한 번 할아버지에게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있는데 왜 나는 둘 다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100일 밤만 자면 돌아올 거다. 미경이한테 줄 능금(사과)을 구하러 간 거다”라며 달랬다.
그 뒤로 전 씨는 달력에 엑스(X) 표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동네 꼬마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너는 빨갱이 자식이다” 손가락질 할 때도, 멀리 지나가는 아저씨만 보이면 무작정 따라갔다.
우리 아버지일까. 우리 아버지도 저런 얼굴을 하고 돌아오실까.
그 사무치는 그리움이 아릿하게 전 씨의 마음에 박힌 채 70년 넘는 세월이 지났다.
“그날 제 얼굴을 다 적시도록 흘린 아버지의 눈물이, 제 눈물이 돼 평생을 흘리나 봅니다.”
전 씨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의 능금(사과)도, 국가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
결국 아버지는 능금을 들고 돌아오지 않았다.
전 씨는 이제 국가의 사과를 7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다.
DNA 검사를 통한 유해 신원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지금,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 1441기가 세종 추모의 집으로 옮겨졌다.
모두 산내 평화공원에 모셔야 맞지만 공원은 현재 첫 삽조차 뜨질 못한 상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다 서다만 반복하는 사업에 전 씨는 가슴을 쳤다.
무심한 시간은 정직하게 흘렀고 전 씨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족들은 고령에 접어들었다.
“유족 없는 추모 공원은 아무 소용없어요. 진실과 화해라면서, 진실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질 않으니 화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날 만난 전 씨는 지난 달 발굴된 유골에서 발견한 탄피를 보여줬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그 작은 탄피 조각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아마 누군가가 평생을 쏟은 눈물의 무게이자, 우리가 느껴야 할 책임감의 무게였으리라.
유독 뜨거웠던 날씨 탓이었을까.
인터뷰가 끝나고 전 씨와 인사를 나눈 뒤 돌아서서 걷는 그 길이, 참으로 길고 또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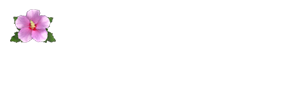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