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의 시작은 언제일까. 양력 1월1일부터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음력설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가 하면 명리학에서는 입춘을 띠가 바뀌는 날로 보기도 한다. 그제가 입춘이었고 이레 뒤가 설이니 지금 우리는 신축년 소띠 해 어귀에 와 있는 셈이겠다.
소는 오래전부터 사람과 친숙한 동물이고 인간사의 흥망성쇠와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가축이었다. 이중섭의 소 그림이나 영화 <워낭소리>는 그렇게 소와 함께한 경험과 추억을 담은 작품들이다. 소가 드리운 존재감은 시와 소설에서도 뚜렷하다.
이순원의 장편소설 <워낭>은 대관령 아래 차무집 집안의 소 12대와 주인들의 120여년에 걸친 이야기를 유장하게 풀어낸다. 이 소설에서는 소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저희끼리 대화도 나눈다. 사람들 또한 “생업의 우정”으로써 소를 대한다. 제가 먹던 밥을 여물과 섞어서 소에게 주거나, 일을 마친 뒤 주인과 소가 막걸리를 나눠 마시는 식이다. 일제 시절 주인을 괴롭히던 관리를 들이받고 면소 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뒤 결국 헌병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소 화둥불의 “의기”는 소에게도 인간의 고통과 분노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한다.
소설 마지막 대목에서 소설가인 형과 1961년 신축년생인 아우는 <워낭소리>를 본 뒤의 감흥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공유한다. 형제는 자신들이 어릴 적에 키웠던 소 검은눈을 추억하며 “그 소가 우리 형제한테는 또 다른 형제나 마찬가지였는데”, “말 못하는 소가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고 가르쳐준 게 그만큼 크고 많았다는 뜻이겠지”라는 등의 말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당사자인 검은눈에 따르면 “사람들이 소 모르게 소 이야기를 하듯 소들도 사람이 모르는 밤에 사람이 모르는 이야기를 나누는 법이었다.”
김종삼의 짧은 시 ‘묵화’는 영화 <워낭소리> 및 소설 <워낭>과 통하는 세계를 보여준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묵화’ 전문)
먹으로 그린 그림을 뜻하는 제목처럼, 시는 고요하고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준다. 인간과 짐승 사이에 굳이 소리 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심전심과 동병상련의 정이 뭉클하다.
전성태의 단편 ‘소를 줍다’는 홍수로 떠내려온 중소를 주워 애지중지했다가 나중에 소의 주인이 나타나면서 좌절하는 소년을 등장시킨다.
한편 김도연의 장편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에서는 말하는 소가 사람과 동행이 되어 전국을 주유한다. 키우던 소를 팔려고 우시장에 나왔다가 허탕친 ‘나’와 막 남편의 장례를 치른 그의 옛 애인이 소와 함께 트럭을 타고 여행하는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의 여정 ‘심우도’를 떠오르게 한다.
“소의 커다란 눈은 무언가 말하고 있는 듯한데/ 나에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소가 가진 말은 다 눈에 들어 있는 것 같다”
김기택의 시 ‘소’에서 소의 맑고 커다란 눈은 무언가 할 말을 간직하고 있는 “동그란 감옥”으로 묘사된다. 소의 눈이 감옥인 까닭은 할 말을 내뱉지 못하고 그저 담고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화자인 인간은 그 눈에 담긴 소의 말을 듣고자 애써 보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한다. 소 역시 제 안의 말을 인간에게 들려줄 수 없기에 다만 여물을 반추하는 행위로써 답답한 속내를 드러낼 따름이다.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서/ 소는 여러 번 씹었던 풀줄기를 배에서 꺼내어/ 다시 씹어 짓이기고 삼켰다간 또 꺼내어 짓이긴다.”
소가 그 커다란 눈망울 속에 감추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 이중섭은 소 그림을 여럿 그렸을 뿐만 아니라 ‘소의 말’이라는 시도 한 편 남겼다. 피난 시절 그가 아내와 어린 두 아들과 함께 복대겼던 서귀포 단칸방에 가면 그 시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소의 말은 우선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이라 표현된다. 그리고 그 숨결에 얹힌 진실,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이라는 구절에서는 이중섭의 신산하고 고단한 삶과 함께 그의 오산고보 선배인 백석의 그림자가 짚인다.
이렇듯 소의 말이란 대체로 여리고 순수하며 묵묵하되 심지가 곧다. 신축년 새로운 시간은 그런 소의 뜻과 말을 새기는 날들이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최재봉, "소의 말", 한겨레신문, 2021.2.5일자. 2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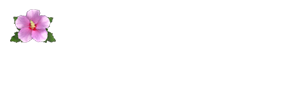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