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영원한 마당발 김종규 이사장의 교유기
김종규가 걸어온다, 묵은 정객이 에워싸고 있다
글 :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kimchi@chosun.com
작년 10월 펴낸 김재석 시인의 시집 《목포 인물시》에 이런 인물이 등장한다.
문학전집 낳아 작가들에게 힘 실어준
독서신문 만들어
국민의 교양을 한층 높인
형 밑에서 실력을 닦은 별이지
마지막으로 할 일이라곤
출판의 역사를 정리하여
영구히 보존 발전시키는 것인데
그게 삼성출판박물관이라고
어딘가에 처박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책들을 찾아
새 생명 불어넣어 주고
잠자리까지 제공하고 있지 (하략)
-김재석의 시 ‘김종규’ 중에서 일부
이 시의 주인공은 김종규(金宗圭·82) 삼성출판박물관장이자 특수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이다. 김 시인은 김 이사장을 평생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묘사를 했을까. 국내 문화계에서, 그리고 목포 예술계에서 김 관장의 면면이 알려졌기 때문이리라.
고은 시인의 ‘인물 박물지’인 《만인보(萬人譜)》(전 30권)에도 그가 등장한다.
김종규가 걸어온다
저쪽에서 먼저 알아보고 손들어
벌써 사람과 사람이
반가움의 무덤에 파묻힌다
왜 그런지 그의 주위에는
예술가 교수 정객 묵은 정객
회장 사장들이
판소리 다섯마당으로
에워싸고 있다
언젠가 껄껄 웃음 보따리
-고은의 ‘만인보-김종규 편(編)’ 중에서 일부
실제로 만나보니 그는 늘 껄껄껄 웃음이다.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함께 상대를 움츠러들게 하는 통찰력도 있다. 지난겨울 만나 종일 인터뷰하고 종종 전화로 안부를 전하다가 폭염주의보가 내린 지난 7월 5일 다시 만났다. 덕수궁 중명전(重明殿) 2층을 통째로 쓰고 있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실에서다. 100여 년 전 고종 황제(高宗·재위 1863~1907년)가 쓰던 편전(便殿)을 사무실로 쓰는 것을 보면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덕수궁 중명전에 위치한 문화유산국민신탁
전남 벌교 보성여관.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첫 사업은 전남 보성군 벌교초등학교 앞에 있는 보성여관의 관리 복원이었다. 2012년 재개관 후 명소가 됐다.
올해는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창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다. 약 1만5000여 명의 회원이 문화유산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기자는 일찌감치 문화유산 지키미가 될 수밖에 없었다. 김 이사장이 보는 앞에서 입회원서를 쓰고 김종규의 ‘마당발 사단’ 끝자락에 보일락 말락 한 이름을 올렸다. 누가 불면(세월이 지나면) 금방 꺼질(잊힐)지 모른다.
“우리가 문화·자연 유산을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후손들도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7년 출범한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아픈 역사를 겪고 산업화의 바람으로 안타깝게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일부는 아쉽게도 외세의 침입 때 약탈을 당하거나 외국으로 반출됐고, 잘 보전하지 못해 훼손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적 맹점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유산을 신탁받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국민의 기부금으로 매입해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무관심과 문화 무지의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의 맨 앞에서 김 이사장이 지휘봉을 들고 서 있다.
그는 “동구 밖 당산나무도 보존해야 할 유산”이라 말했다. 이 말이 기자에게 울림을 주었다. ‘동구’와 ‘당산나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첫 사업은 전남 보성군 벌교초등학교 앞에 있는 보성여관의 관리 복원이었다. 보성여관은 소설·영화 《태백산맥》에서 반란군 토벌대장 임만수와 대원들이 머무는 ‘남도여관’으로 등장한다. 문화재청은 2004년 보성여관을 등록문화재(132호)로 지정한 뒤 사들여 국민신탁 측에 관리를 맡겼다. 보성여관은 현재 벌교 지역 여행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애국자가 된 기분이란…
2018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상의 집이 재개관하면서 시민들이 구경을 하고 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이 후원을 통해 모은 자산으로 매입했다.
그동안 국민신탁은 후원을 통해 모은 자산으로 ▲이상(李箱·1910~ 1937년) 시인의 옛집 ▲경주 남산 지킴이이자 향토사학자 윤경렬(尹京烈·1916~1999년) 선생 옛집을 매입했고, 기업으로부터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경기 군포)을 기증받아 보전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어떤 후원 회원은 가입을 한 후 ‘애국자가 된 기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분만이 아니라 실제 애국을 하신 것이다. 애국은 특별한 게 아니다. 문화유산 지킴이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 자체가 애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나?”고 말했다.
▲울릉도 도동리 일본식 가옥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102년 만에 되찾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 공사관 환수도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다.
“문화유산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지켜갈 때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엄격한 문화재보호법도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고(古)건축물도 전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김종규 이사장은 몇 달 전 《가례집람》 책판(冊版) 9장 등 54장을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遯巖書院, 1634년 창건)에 기증했다. 책판은 인쇄 장치 중 하나로 나무 판에 글을 새겨서 책을 찍어내는 판을 말한다.
이 책판은 활자본과 달리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원본. 조선 중기 유학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1548~1631년)이 주자(朱子·1130~1200년)의 ‘가례(家禮)’를 증보·해석한 《가례집람》을 비롯해 《사계선생연보》 《사계선생유고》 《사계전서》 등을 펴내는 데 쓰인 귀중한 유물이다. 그간 ‘이빨 빠진’ 채 흩어져 있던 책판들이 비로소 치열 고른 완제품으로 채워졌다.
약탈, 도난, 밀매(단언할 순 없지만) 등으로 세상에 떠돌던 것을 50년 전 김 이사장이 인사동에서 구입한 것이다.
“당시 가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파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건 생각이 납니다. ‘서울 변두리 집 두 채 값은 된다’고 말이죠.”
지금은 변두리 집 두 채가 아니라 가격을 감히 따질 수 없다.
이 말을 하면서도 그는 “일부 씹는 사람은 잘난 척한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순수한 마음에서 기증했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예학(禮學)을 집대성했다는 큰 의미를 지닌 책인데, 돈암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됐을 때 기증하려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증이 늦어졌죠. ‘딱 한 점만 빼고 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지만 ‘딸자식 시집보낼 때 한 명만 빼고 보낼 수 있나, 에라!’ 하고 결심을 굳혔고, 지금은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소박스 ‘삼성출판박물관’은…
삼성출판박물관이 소장한 국보 제265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김종규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출판 전문 박물관인 삼성출판박물관장,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을 겸하고 있다. “박물관은 한 나라 문명의 척도”라는 게 그의 평소 지론이다. 1990년 6월 29일 개관했으며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해 있다.
국보 제265호 초조본(初雕本)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주본(周本)(권13)과 보물 제758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를 비롯, 보물 제745호 《월인석보(月印釋譜)》(권22), 보물 제1091호 《제왕운기(帝王韻紀)》 등 국보 1점, 보물 11점을 포함해 10만여 점, 한국 근·현대 출판인쇄물과 고활자·인쇄기구·문방사우 등 40여만 점을 소장하고 있다.
고서적 수집을 시작한 건 형인 김봉규(金奉圭) 삼성출판사 창업회장의 영향이 컸다. 1965년 삼성출판사 부산지사장으로 일할 당시부터 보수동 헌책방 골목을 돌아다니며 고서를 대거 사들였다. 피란 온 지식인들이 생계를 위해 내다 판 희귀 서적이 많았다고 한다. 김종규 이사장의 말이다.
“당시 다른 사람들이 도자기나 서화(書畵)에 관심을 가질 때 저는 고서적을 샀어요. 주위 사람이 저더러 ‘새 책 팔아 헌 책 산다’고 했죠.”
이어령과 다른 김종규 스타일
《조선일보》의 연재 칼럼 ‘조용헌 살롱’의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에 따르면 문화계 원로 중에는 2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한다.
고(故) 이어령(李御寧·1933~ 2022년) 선생은 공중폭격이다. 워딩의 귀재이다. 반면 김종규 이사장은 땅개작전이다. 땅개작전의 구체적 방법은 축사를 해주러 다니는 일이다. 70대 중반의 전성기 때만 하더라도 하루 7~8군데 축사를 해주곤 하였다. 7~8군데를 하려면 시간대별 교통 상황, 동선이 엉키지 않도록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축사의 달인’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화예술계의) 마당발, 달인, 대부, 마피아, 보스라는 단어의 촘촘한 그물망의 중심이 모두 ‘김종규’로 귀결돼 있다.
“시골 출신인데도 사람들은 저를 문화계의 마당발이라 합니다. 과거 강홍빈 전 서울역사박물관장도 러시아 대사에게 ‘코리아 뮤지움 마피아 보스’라고 소개합디다. 그리고 축사의 달인이라 부릅니다.”
그를 문화계의 마당발, 축사의 달인으로 만든 화법이란 어떤 것일까. 조용헌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첫째 이야기 도중 지방 방송을 가급적 ‘끄고’ 공통분모를 찾는다. 둘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 실수로 자존심을 건드렸으면 빨리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일명 ‘고무찬양 화법’.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넷째는 대화의 윤활유인 유머 구사다.
“우리는 자기 돈 써가며 사람을 사귀고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공들여 상대와 만나는데 그릇이 되는 고수(高手)와 만나야 해요. 무언가 일을 추진할 때 고수는 상대의 마음을 알아보고 즉시 행하지만 하수(下手)는 뒤로 자꾸 미룹니다. 건축처럼 사람도 기본이 흔들리면 그 사람 전체가 흔들려버립니다.”
마당발과 달인의 비밀
그의 좌우명은 ‘시인신물념 수시신물망, 무도인지단 무설기지장(施人愼勿念 受施愼勿忘, 無道人之短 無說己之長)’이다. ‘누구에게 베푼 것은 결코 생각하지 말며, 받은 것은 결코 잊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자기 자랑은 함부로 하지 마라’는 뜻이다. 중국 후한 시대의 학자인 최자옥(崔子玉·78~143년)의 이 문장에 그만의 화법, 대인관계의 비밀이 담겨 있다.
김 이사장은 “좌우명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솔직히 잘 안 돼요”라며 너털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진지하게 덧붙였다.
“개인적인 인연을 꺼낼 때 칭찬과 덕담을 이야기하고 그의 넉넉함과 인품을 화제로 삼아야지 균형을 잡는다고 말 끝에 ‘옥에 티라면 뭣뭣이다’ 식의 아쉬움을 절대 말해선 안 돼요. 그럼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또 이런 말도 했다.
“명함을 받았을 때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예의가 있어야 해요. 어떤 사람은 명함을 받는 둥 마는 둥 함부로 합니다. 그러곤 잊어버리죠. 어떤 이는 받은 명함을 대화 중에 손에 쥐고서 막 구겨요. 그럼 그 사람과 관련한 인맥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명함이야말로 인맥의 시작이죠.”
曉堂 선생과의 망년지교
효당 최범술 스님과 경남 사천시 봉명산 자락에 있는 사찰 다솔사. 야생 상태의 차밭을 효당 스님이 가꾸기 시작해 오늘에 이른다.
김 이사장은 ‘만남’과 ‘사귐’의 깊은 맛을 알려준 두 분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사귐에 나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망년(忘年)인데 그런 만남을 ‘망년지교(忘年之交)’ ‘망년지계(忘年之契)’라고 합니다.
표암 강세황(姜世晃·1713~ 1791년)과 단원 김홍도(金弘度·1745~1806년)는 32세 차이죠. 김홍도하고 자하(紫霞) 신위(申緯·1769~1845년)는 24세 차이입니다. 표암과 자하의 나이 차이는 56세나 됩니다. 표암이 일흔아홉으로 생을 마감할 때 자하는 스물넷이었지만 이들의 사귐은 그리도 깊었고 나이를 떠났다고 해요.”
그는 숨을 돌리더니 “제게도 위아래의 많은 사귐이 있지만 제 삶에 많은 도움과 바뀜을 가져다주었던 웃어른 두 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회고했다.
벌써 50여 년 전인 1968년, 그가 삼성출판사 부산지사장 시절에 서예로 이름 높은 청남(菁南) 오제봉(吳濟峯·1908~1991년) 선생 서실에 갔다가 효당(曉堂) 최범술(崔凡述·1904~1979년) 선생을 알게 되었다. 그가 서른도 채 안 되던 무렵이다.
효당은 1916년 경남 사천 다솔사에서 출가하여 합천 해인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3·1운동 당시 등사판으로 해인사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각지에 배포한 애국지사였다. 광복 후 해인사 주지, 국민대 이사장 등을 지냈고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그 어른은 당시 예순이 넘은 때였고 부산에서 가까이 지낸 분들이 묘하게도 저보다 연장자들이었어요.
이듬해 정초 연휴에 청남 선생, 향파(向破) 이주홍(李周洪·1906~ 1987년) 선생을 비롯한 몇몇 어른과 함께 효당이 계시는 다솔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밤을 지새우는 동안 우리는 쉽게 말해 풍류객들답게 단번에 나이 차이를 넘기고 맘껏 즐겼는데 무엇보다 효당 어른 덕에 차(茶)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오랫동안 꼼짝 못 하리만큼 차에 푹 빠져들었어요. 젊어서 그분을 만나게 되어 그리 덤벙대고 시건방지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잠재워졌는지 모릅니다.”
시인 구도자 具常과 만나다
왼쪽부터 중광스님과 김종규 이사장, 구상 시인, 혜련스님.
또 한 분은 시인 구상(具常·1919~ 2004년)이다. 계속된 그의 말이다.
“구상 시인의 시심이나 아무런 사심 없는 구도자적인 무애자적(無碍自適)한 품성을 늘 옆에서 그 그늘이라도 맛볼 수 있음이 얼마나 저에게 다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많은 문화예술계의 사람을 가까이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분은 저에게 선다반야(禪茶般若)와 문자반야(文字般若)의 멋을 각각 일깨워 저 스스로를 기름지게 하였던 분입니다.”
그러더니 구상 선생과 자주 어울렸던 중광스님에 대한 에피소드로 이야기가 이어졌다.
한번은 1992년 대통령 후보로 나선 현대 정주영(鄭周永·1915~2001년) 회장이 구상 시인에게 한번 만나자는 청을 넣었다. “차를 그쪽으로 보낼까요?” “보낼 필요 없습니다. 나도 차 있어요.” 자기도 차가 있다는 대답을 자연스럽게 해놓고 구상 시인은 까마득한 후배 김종규에게 바로 전화를 했다. “종규야! 내 차 보내라.” 구상은 김종규에게 차 좀 보내달라는 부탁을 할 때마다 자기 차도 아니면서 ‘종규야 내 차 보내라’가 정해진 멘트였다고 한다.
이런 일화도 있다. ‘걸레 스님’을 자처하며 화가로 활동한 중광스님(重光·1934~2002년)도 1980년대 어느 날 저녁 늦게 김종규의 자가용을 빌려 타고 화곡동 암자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 예상한 시각보다도 한참이나 늦게 기사가 돌아왔다. 이유인즉슨 술에 취한 중광이 차 안에서 오줌을 눠버렸다는 것이었다. 세차장에서 차 내부를 청소해야만 했다. 며칠 후 중광을 만난 김종규는 한마디 했다.
“내 차가 ‘벤조’구먼, 벤츠보다 한 단계 위가 변소까지 달린 ‘벤조’여!”
이 말을 듣고 중광스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음…. 나와 대적할 만한 인물일세.”
김 이사장 그릇이 자기와 견줄 만한 그릇이라는 중광의 탄성이었다. 이후 나이를 넘어 두 사람의 우정이 깊어졌다고 한다.
“내 인생에 길을 내준 김봉규와 이어령”
어머니 윤금임(尹錦任) 여사와 김봉규 삼성출판사 창업회장, 김종규 이사장.
효당, 구상과 ‘망년지교’를 맺었다면 “내 인생에 길을 내준 고마운 두 분”으로 자신의 형인 김봉규 삼성출판사 창업회장과 이어령 선생을 꼽는다.
“형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을 겁니다. 형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학교를 다녔으며, 어떻게 서울로 유학 가서 대학을 마칠 수 있었겠어요. 8세 차이인데 학창 시절, 부모님 대신 학부모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는 김봉규 회장의 뒤를 이어 1980년 삼성출판사 상무이사, 82년 부사장, 89년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회장을 맡았었다.
“형이 출판업에 뛰어들던 시절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00달러의 전형적인 후진국이었습니다. 초근목피와 보릿고개가 엄연하던 시절이었죠. 그런 시절에 누가 책을 사보겠는가 싶었지만 형은 책에 대한 갈증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책과 출판이 한 사회와 문화를 주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김봉규 창업회장은 지난 1951년 3월 전남 목포에서 대양서점으로 출판업과 인연을 맺고 꼭 60년 전인 1962년 서울에 입성, 종로구 관철동에 수도서적을 열었다. 2년 뒤인 64년 삼성출판사를 설립, 《소년소녀우량문고》(전 6권) 발간을 시작으로 국내 최고의 출판기업으로 성장한다.
50년 전 이어령 편집주간의 《문학사상》을 창간하다
1972년 10월 첫 발행한 《문학사상》 창간호.
한국 출판 사상 첫 개인작품 선집으로 1966년 출간된 《박종화 대표작선집》(전 5권)과 《김동리 대표작선집》(전 6권), 이듬해 한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이 된 《한국여류문학전집》(전 6권)도 기억할 만하다. 당시 출판기념회에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陸英修·1925~1974년), 박종화(朴鍾和·1901~1981년) 예총 회장, 김활란(金活蘭·1899~1970년) 이화여대 총장, 홍종철(洪鍾哲· 1924~1974년) 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1968년 유주현(柳周鉉·1921~ 1982년)의 실록 대하소설 《조선총독부》는 한국 출판 사상 최초로 한국어판(전 5권)과 일본어판의 동시 출판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화제를 모았다.
1972년 월간 《문학사상》을 창간한 기억도 잊을 수 없다. 김 이사장의 말이다.
“이어령 장관이 삼성출판사 편집고문으로 1960년대부터 참여했는데 올해로 50주년이 된 《문학사상》을 창간할 당시 편집주간이 이어령, 발행인이 우리 형님이었습니다. 《문학사상》은 창간호 발간 일주일 만에 재판에 돌입했는데, 순수 문학교양지로서 이러한 예는 전무후무한 예였죠.
훗날 시인 이상의 서울 통인동 집을 문화유산국민신탁이 매입하여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학사상》 창간호 표지가 이상의 친구 구본웅(具本雄·1906~1953년) 화백이 그린 이상 초상이잖아요. 인연이란 게 참으로 묘하다 싶어요. 물론 지금은 《문학사상》이 삼성출판사와 이별했지만….”
박경리 《토지》와 《제3세대 한국문학》
1978년 ‘전국 도서전시회’에 참석해 삼성출판사 전시장을 둘러보는 대통령 영애 박근혜의 모습이다.
1973년은 도서의 100만 부 판매 기록을 달성한 해로 기억된다. 문고판 《한국문학전집》(전 102권)은 발간 1주년을 맞기도 전에 100만 부를 돌파했다. 그 기념 자축연에 참석한 박종화·김동리(金東里·1913~1995년)·황순원(黃順元·1915~2000년) 등은 “한국 문단의 기적”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또 그해 발행된 박경리(朴景利·1926~2008년)의 대하소설 《토지》는 한국 문학사에 남을 금자탑이 되었다.
1974년 전 100권의 《세계문학전집》과 전 60권의 《세계사상전집》을 기획(이어령·박종홍·이용희·신일철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가)한 것이나 총 4000여 면에 30만여 어휘를 수록한 백과사전식 《새우리말 큰 사전》(1975년)은 큰 반향을 낳았다.
또 1985년 《제3세대 한국문학》(전 24권)이 우리의 출판 사상 신기록을 수립한 일도 있다. 발간 1년 만에 250만 부라는 기적 같은 판매 기록을 세웠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국제PEN대회가 열렸을 때 삼성출판사가 각국 대표 500여 명의 작가들을 워커힐호텔로 초대해 오찬을 베풀고 우의를 다진 것도 김봉규·종규 형제의 합작이었다. 지금도 원로 문인들은 당시 처음 내한한 구(舊)소련의 시인, 소설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을 기억하며 두 형제를 떠올린다.
동생은 지금도 2~3일마다 형에게 전화를 걸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주고받는다.
책의 조산원, 삼성출판사
1990년 삼성출판박물관 개관 당시 김봉규 창업회장과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소설가 김동리, 김종규 박물관 관장(맨 왼쪽).
다음은 김재석 시인의 《목포 인물시》에 나오는 시 ‘김봉규-삼성출판사’다.
움베르토 에코가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훌륭한 자식 갖는 일과
책 낳는 일이라 했지(…)
책의 조산원, 삼성출판사가
이 땅에 없었더라면
이 땅의 문학은 지금보다
몇 등급 아래였겠지
세계의 명화, 세계의 명곡
마음의 양식이란 양식은
다 맛보도록 해준 별이
삼성출판사였지(하략)
-김재석의 시 ‘김봉규-삼성출판사’ 일부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가 그해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당시 김 이사장은 삼성출판박물관을 이끌며 한국박물관협회장으로 대회 조직위원장(공동 김병모 한양대 교수,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맡았다.
2000여 명에 달하는 세계 유수 석학 및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였다. 당시 명예대회장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였다. 그의 회고다.
“공동 조직위원장이 3명이었는데 다들 대학교수라서 모금을 못 해요. 할 수 없이 제가 나설 수밖에요. 대회 운영비 42억원 중에서 7억원밖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당시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와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에게 손을 벌렸죠. 이 시장보다 손 지사를 먼저 찾아갔는데, 이유는 손 지사가 큰돈을 벌어본 분이 아니잖아요. 보통 기업인이나 자수성가한 이는 10원 동전도 따지거든요. 손 지사에게 ‘3장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마 3000만원으로 알았을 거야. 그런데 3억원을 받아냈어요.
그다음, 이명박 시장을 찾았지요. 저를 보자마자 앓는 소리를 하대요. 그런데 손 지사가 이미 3억원을 내놨는데 서울시장 체면이 있지 어쩌겠어요.
무슨 모금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 문단에서 뭘 해도 창업회장을 어려워해서 잘 안 찾아가요. 전부 저에게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집안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똑같이 막 퍼주려 하거나 똑같이 깍쟁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아쉬울 때 다시 찾아오겠어요? 부부관계도, 나라살림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삼성출판사는 어떤 모습일까. 삼성출판사가 만든 초·중등 영어 전문학원 ‘삼성영어 셀레나’가 12년 연속 학부모가 뽑은 교육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교육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종합인물세트 이어령과의 인연
1974년 한국을 찾은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규(왼쪽)와 김종규 이사장(오른쪽), 이어령 선생(가운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어령 선생과의 인연도 잊을 수 없다. 인연을 맺은 지 60년 정도 됐을 것이다.
그가 삼성출판박물관을 연 것도 이어령 선생 때문이다. 초대 문화부 장관에 취임한 이어령 선생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2000년대까지 박물관 1000개는 돼야 하고 출판박물관은 필수”라고 박물관 설립을 재촉했다고 한다.
“평소에는 그렇게 천재이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지만, 초대 문화부 장관을 맡으면서는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엄청난 추진력을 보였습니다. 국립국악원 행사와 남북문화교류 사업을 앞두고선 저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신설 부처라 돈이 없다,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을 비롯해 한국 문화계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셀 수 없이 하셨죠. 그분은 문인, 학자, 교수, 문화행정가의 종합세트이자, 한국의 앙드레 말로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문화가 세계화되는 데 누구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또 한류의 촉매 역할을 한 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어령 선생은 초대 문화부 장관 시절, 삼성출판박물관의 개관을 맞아 이렇게 반겼다. 다음은 박물관 개관 축사 중 일부다.
〈… “출판박물관은 우리의 악기입니다. 책은 옥퉁소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가까이 가서 입술을 대고 허파 깊숙이 호흡을 하면 아름다운 음향이 들려옵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파도처럼 일어서는 만파식적, 그 옛날 기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던 만파식적의 그 피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들어도 명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전국 곳곳에 작은 박물관이 생겨난 것도, 삼성출판박물관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도 이어령 선생 덕이다. 문득, 선생이 간절하게 그리워진다.
돌이켜보니, 이어령 선생의 빈소에서 기자는 김 이사장과 조우했었다. 대개 이어령 지인들이 김 이사장과 겹쳐졌다. 또 선생이 작년 10월 박서보 화백과 함께 ‘금관 문화훈장’을 받을 때 선생의 자택인 영인문학관으로 보낸 김 이사장의 축하난도 떠오른다.
이어령 선생이 노태우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쓴 헌시(獻詩) ‘영전에 바치는 질경이 꽃 하나의 의미’를 소리꾼 장사익씨가 유려한 붓글씨로 쓰게 한 것도 김 이사장이었다. 선생이 이 헌시 액자를 자택 거실의 눈에 띄는 자리에 세워둔 일도 기억난다.
김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이어령 장관도 떠나버리고…”라며 아쉬워했다. 그래서일까. 요즘 그는 ‘인생 잔고’란 말을 즐겨 쓴다.
“나이 들수록 인생 잔고를 잘 쌓고 관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해요. 세상을 떠난 후에 비로소 남들에 의해 결산되는 한 인생의 총량, 선(善)한 일의 합계 같은 것이지요.”
선한 잔고를 더 쌓기 위해 그는 오늘도 마당발, 달인으로 뛰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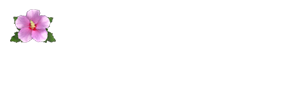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